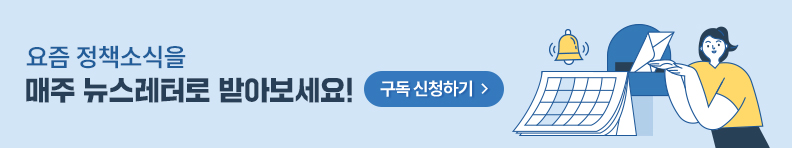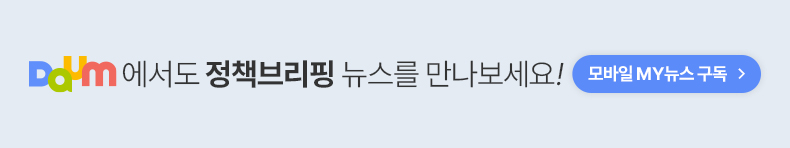콘텐츠 영역
로봇 그리고 ICT 올림픽…인간과 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1965년 ‘앙가주망’이란 글에서 선구적인 통찰을 보여줬다. 그는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참여의 문제를 논하며 일종의 미래 문명인 ‘기계천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오늘의 문화로 번역하면 퍼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쯤이 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그가 규정한 대로 기계가 천사가 된 사회다. 천사의 미소 뒤에는 물론 악마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컴퓨터, 나아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 알파고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갈음하는 시대라면 인간은 어디서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할까.
문화예술의 자율성도 참여의 문제도 기계라는 이름의 천사 앞에서는 이내 빛을 잃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고전적 명제는 수명을 다한 것인가. ‘생각’이 ‘클릭’으로 대체되는 전복의 시대, 우리는 전자사막 위를 걷는 디지털 유목민이 됐다. 온갖 디지털문화론이 출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메타담론까지 등장해 우리를 풍요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인도한다. 그러니 어찌 디지털 시대의 신인류 ‘호모 디지쿠스’로 진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경쟁 상대는 이제 인간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는 로봇이 쓴 글이 신춘문예를 통과하기도 했다. 인간이 로봇과 앞을 다투는 세상이다. 미국의 SF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바이센테니얼 맨’은 미래사회의 로봇이 감정과 지성을 갖춰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인간다운 기계와 비인간적인 인간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물음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성찰케 한다. 비록 소설 속 이야기이지만 인공지능(AI) 로봇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도 한다. 박성환 작가의 SF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에서는 절에 들어가 아침마다 동자승처럼 마당을 쓸며 독경 소리를 듣던 로봇이 마침내 도를 깨우쳐 보살이 되어 설법까지 한다.
인간과 로봇의 경쟁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로봇과 인간이 나란히 오페라에 나와 성악 대결도 펼친다. 3월 초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를 오페라 ‘완벽한 로봇 디바, 에버’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다. 인간을 돕고 소통하는 소셜형 로봇이 오페라공연에 도입된 적은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며 노래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이 작품에서 로봇과 인간은 오페라 주역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연을 펼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달은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명실상부한 ‘로봇올림픽’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성화 봉송에 나섰고 번외 행사로 스키로봇 챌린지도 열렸다. 벽화로봇 ‘아트봇’은 관람객들에게 벽화 그리기를 시연하며 인간의 붓보다 정교한 로봇 붓의 기술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로 관중석 전체를 스크린화하고, 형형색색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 것이다. 요컨대 평창올림픽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축제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끝 간 데 없는 디지털 욕망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차가운 기술이 연출하는 현란한 문화에 인간의 숨결은 과연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가, 뜻 모를 ‘추상(抽象)’의 바다에 살가운 ‘구상(具象)’은 얼마나 흘러들어 있는가. 테크놀로지의 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를 성찰해야 한다. 디지털에도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문학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지능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역사를 다루며 신이 된 인간, 즉 ‘호모 데우스’를 이야기한다. 전작 ‘사피엔스’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말한 그는 후속작 ‘호모 데우스’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일러준다. 7만 년 전 인지혁명은 사피엔스의 마음을 탈바꿈시켜 별 볼 일 없는 아프리카의 유인원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도록 했다. 이제 시대는 사피엔스의 뒤를 이어 호모 데우스의 탄생을 예고한다. 우리는 어떤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
21세기의 초인간 호모 데우스를 전망하는 우리의 시선은 착잡하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신의 자리를 넘보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축복일지 재앙일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펑크 소설의 개척자 윌리엄 깁슨의 말이 아니더라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평창 ‘ICT 올림픽’을 치르며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의 힘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기술 유토피아’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인간과 기계의 조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종면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등을 거쳐 수석논설위원을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 문학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